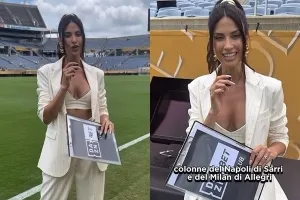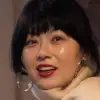мЈјмӣҗк·ң мҶҢм„Өк°Җ
к·ёл ҮлӢӨл©ҙ кі м–‘мқҙлҠ” м–ҙл–Ёк№Ң. кі м–‘мқҙлҠ” л°ҳл ӨлҸҷл¬ј мӨ‘м—җм„ңлҸ„ м—¬н–ү лӘ©лЎқм—җм„ң мқјлӢЁ лІҲмҷёмқҳ лҢҖмғҒмқҙлӢӨ. кі м–‘мқҙлҠ” кІүмңјлЎңл§Ң ліҙл©ҙ мЈјмқём—җкІҢ лі„лӢӨлҘё м№ңнҷ”л Ҙмқ„ лӮҳнғҖлӮҙм§Җ м•Ҡкі , лҸ…лҰҪмӢ¬мқҙ к°•н•ң лҚ°лӢӨ лӮҜм„ кіі, лӮҜм„ мӮ¬лһҢм—җ лҢҖн•ң кІҪкі„мӢ¬мқҙ лӮЁлӢӨлҘҙлӢӨ.
кІ°лЎ м ҒмңјлЎң нҠ№лі„н•ң кҙҖкі„лҘј л§әмқҖ мӮ¬мқҙк°Җ м•„лӢҢ кІҪмҡ° кі м–‘мқҙлҘј лҚ°лҰ¬кі м—¬н–үмқ„ к°„лӢӨлҠ” кұҙ л¶Ҳк°ҖлҠҘм—җ к°Җк№қлӢӨ. н•ҳлӢӨлӘ»н•ҙ кіөмӣҗмқҙлӮҳ к°Җк№Ңмҡҙ кіімқ„ н•Ёк»ҳ мӮ°мұ…н•ҳлҠ” кІғ м—ӯмӢң м—¬к°„н•ҙм„ мүҪм§Җ м•ҠмқҖ мқјмқҙлӢӨ.
к·ёлҹ°лҚ° мһҗм„ёнһҲ ліҙл©ҙ мқёкө¬ 1000л§ҢлӘ…мқҙ л„ҳлҠ” м„ңмҡёмӢңлҜјл“ӨмқҖ кұ°мқҳ л§Өмқј кі м–‘мқҙл“Өкіј н•Ёк»ҳ м—¬н–ү мӨ‘м—җ мһҲлҠ” кІғ к°ҷлӢӨ. л¬јлЎ мқҙл•Ңмқҳ м—¬н–үмқҖ мҡ°лҰ¬к°Җ м „нҳ•м ҒмңјлЎң л– мҳ¬лҰ¬лҠ” мқјмғҒмқ„ лІ—м–ҙлӮң мүјмқҙлһҖ к°ңл…җкіјлҠ” мЎ°кёҲ лӢӨлҘҙлӢӨ.
м—¬н–ү мһҘмҶҢм№ҳкі лҠ” лӢөлӢөн• мҲҳ мһҲкІ м§Җл§Ң кі м–‘мқҙл“Өкіј мҡ°лҰ¬мқҳ лҸҷм„ мқҙ л§Өмҡ° л№ҲлІҲнһҲ кІ№м№ҳлҠ” кұё л°ңкІ¬н• мҲҳ мһҲлӢӨ. м¶ңк·јкёё м•„нҢҢнҠё м§Җн•ҳ, л№ҢлқјлӮҳ лӢӨм„ёлҢҖ мЈјнғқ кіЁлӘ© м–ҙк·Җ, м§ҖмғҒ мЈјм°ЁмһҘмқҳ м°Ёлҹүл“Ө л°‘вҖҰ.
кө¬м„қм§Җкі м•Ҫк°„мқҖ м–ҙл‘җмҡҙ кіімқ„ мҠ¬кёҲмҠ¬кёҲ лҸҢм•„лӢӨлӢҲлҠ” кі м–‘мқҙл“Өмқ„ мӢ¬мӢ¬м№ҳ м•ҠкІҢ ліҙкіӨ н•ңлӢӨ. л¬јлЎ мӮ¬лһҢкіј кі м–‘мқҙк°Җ м„ңлЎңлҘј л§ҲмЈјн•ҳлҠ” мҲңк°„мқҖ к·ём•јл§җлЎң м°°лӮҳлӢӨ.
мЎ°мӢ¬м„ұ л§ҺмқҖ кі м–‘мқҙл“ӨмқҖ м°Ёлҹү л°‘мқҙлӮҳ мЈјнғқк°Җ м§Җн•ҳлҘј лҸҢм•„лӢӨлӢҲлӢӨк°Җ м–ҙм©ҢлӢӨ мӮ¬лһҢкіј л§ҲмЈјн•ҳл©ҙ м„ңл‘ҳлҹ¬ мў…м Ғмқ„ к°җм¶°лІ„лҰ°лӢӨ. л•Ңл¬ём—җ кі м–‘мқҙмҷҖмқҳ м—¬н–үмқҖ к·ёлӢӨм§Җ мӢ лӮҳлҠ” м—¬н–үмқҖ м•„лӢҲлӢӨ.
мҡ°лҰ¬лҠ” лҸ„мӢ¬м§Җ кіікіім—җ м„ңмӢқн•ҳлҠ” кёёкі м–‘мқҙл“Өмқ„ л°ҳл ӨлҸҷл¬јлЎң л¶ҖлҘҙкёё мӣҗн•ҳм§Җ м•ҠлҠ” кІғ к°ҷлӢӨ. 집м—җм„ң ліҙмӮҙн•Ңмқ„ л°ӣлҠ” лҸҷл¬јм—җ н•ңн•ҙм„ңл§Ң л°ҳл ӨлҸҷл¬јлЎң л¶ҖлҘҙлҠ” кІҪн–Ҙмқҙ мһҲлӢӨ. н•ҳм§Җл§Ң мғқнғңмқҳ к°ңл…җмңјлЎң ліј л•Ң мӮ¬лһҢкіј лҸҷл¬јмқҳ кҙҖкі„лҠ” м„ңлЎңк°Җ м„ңлЎңм—җкІҢ лҸ„мӣҖмқ„ мЈјкі л°ӣлҠ” мғҒліҙм Ғ кҙҖкі„, мқҙлҘёл°” кіөмғқмқҳ кҙҖкі„мһ„мқ„ нҷ•мқён• мҲҳ мһҲлӢӨ. лҸ„мӢ¬м—җ мқјм •лҹүмқҳ л…№м§ҖлҘј нҷ•ліҙн•ҳкі , ліҙлӢӨ мҫҢм Ғн•ң нҷҳкІҪмқ„ мң„н•ҙ лҸ„мӢң лҜёкҙҖмқ„ мһ¬м •л№„н•ҳл©°, кіөн•ҙлҘј мң л°ңн•ҳлҠ” л¬ёлӘ…мқҳ лҸ„кө¬м—җ мқјм •лҹүмқҳ м„ёмҲҳ л¶ҖлӢҙмқ„ м§Җмҡ°лҠ” кІғ м—ӯмӢң лҸ„мӢңлҘј мӮ¬лһҢл§Ңмқ„ мң„н•ң кіөк°„мңјлЎң мқёмӢқн•ҳм§Җ м•Ҡкё° л•Ңл¬ёмқҙ м•„лӢҗк№Ң. мӮ¬лһҢл§Ңмқ„ мң„н•ң, нҳ№мқҖ мӮ¬лһҢм—җ мқҳн•ң кіөк°„мқҙ м•„лӢҢ, лӘЁл“ лҸҷВ·мӢқл¬јмқҙ н•Ёк»ҳн•ҳлҠ” мғқнғңкіөк°„мңјлЎң мқёмӢқн•ҳкё° л•Ңл¬ёмңјлЎң 여겨진лӢӨ.
н•ҳм§Җл§Ң кёёкі м–‘мқҙл“Өм—җ лҢҖн•ҙ м„ңмҡёмӢңлҜјмқҙ к°–кі мһҲлҠ” мғқк°ҒмқҖ к·ёлӢӨм§Җ мҳЁм •м Ғмқҙм§Җ м•ҠлӢӨлҠ” кІғмқ„ нҷ•мқён• мҲҳ мһҲлӢӨ. мЎ°кёҲ м§ҖлӮң мқјмқҙм§Җл§Ң кі м–‘мқҙ лЁёлҰ¬м—җ мҮ м№Ёмқ„ л°•м•„ л„ЈлҠ” мӮ¬кұҙмқҙ лІҢм–ҙм§Җкё°лҸ„ н–Ҳкі , лӢЁм§Җ 기분 лӮҳмҒң лҲҲл№ӣмқ„ к°ҖмЎҢлӢӨкұ°лӮҳ лҜёмӢ м Ғмқё мғҒмғҒл Ҙм—җ мқҳн•ҙ кі м–‘мқҙлҘј мқҙлҘёл°” мҡ”л¬ј м·Ёкёүн•ҳлҠ” нҶөл…җмқҙ нҢҪл°°н•ҙ мһҲлӢӨ.
лҸ„мӢң лҜёкҙҖмқ„ н•ҙм№ҳкі л№„мң„мғқм Ғмқҙкі м•„мқҙл“Өмқ„ мң„нҳ‘н•ңлӢӨлҠ” л“ұл“ұмқҳ нҺёкІ¬мңјлЎң кі м–‘мқҙлҘј лҢҖн•ҳлҠ” нғңлҸ„м—җм„ң мҡ°лҰ¬лҠ” кіјм—° мғқнғңлҸ„мӢңмҷҖ л””мһҗмқё м„ңмҡёмқ„ мқҙм•јкё°н• мһҗкІ©мқҙ мһҲлҠ” л¬ёнҷ”мӢңлҜјмқём§Җ м§Ҳл¬ён•ҳм§Җ м•Ҡмқ„ мҲҳ м—ҶлӢӨ.
мқҙлҠ” 비лӢЁ кёёкі м–‘мқҙлқјлҠ” н•ҳлӮҳмқҳ мў…(зЁ®)м—җл§Ң көӯн•ңлҗң л¬ём ңк°Җ м•„лӢҲлӢӨ. лҸ„мӢңмқҳ мӨ‘мӢ¬мқҖ л¬јлЎ мӮ¬лһҢмқҙм–ҙм•ј н•ңлӢӨ. н•ҳм§Җл§Ң мӮ¬лһҢмқҙ мӮҙкё° мң„н•ҙм„ мӮ¬лһҢкіј мҪҳнҒ¬лҰ¬нҠё, мӮ¬лһҢкіј л””мһҗмқёл§Ң мЎҙмһ¬н•ҙм„ңлҠ” м•Ҳ лҗңлӢӨ.
лҚ”л¶Ҳм–ҙ мӮ¬лҠ” лҸҷмӢқл¬јл“Ө, мҲЁ мү¬кі нҳёнқЎн•ҳлҠ” лӘЁл“ кІғл“Өкіј н•Ёк»ҳ м–ҙмҡ°лҹ¬м§Ҳ л•Ң 비лЎңмҶҢ лҸ„мӢңк°Җ н•ҳлӮҳмқҳ мҲЁ мү¬лҠ” мң кё°мІҙлЎңм„ң мЎҙмһ¬н•ҳлҠ” кІғмқҙ м•„лӢҢк°Җн•ҳлҠ” мғқк°Ғмқҙ л“ лӢӨ.
кё°нҳ•м ҒмңјлЎң кі м–‘мқҙл“Өмқҳ мҲ«мһҗк°Җ мҰқк°Җн•ң кІғмқҖ кі м–‘мқҙл“Өмқҳ мһҳлӘ»мқҙ м•„лӢҲлӢӨ. мқҢмӢқл¬ј м“°л Ҳкё°лҙүнҲ¬лҘј нӣјмҶҗн•ҳкі лҸ„мӢң лҜёкҙҖмқ„ лҚ”лҹҪнһҲлҠ” нқүл¬јлЎң м „лқҪн•ң кІғ лҳҗн•ң к·ёл“Өмқҳ мһҳлӘ»мқҙ м•„лӢҲлӢӨ. мқјлӢЁ мӮ¬лһҢ лЁјм Җ мӮҙкі ліҙмһҗлҠ”, кё°кҙҙн•ҳкІҢ 진нҷ”лҗң м•ҪмңЎк°•мӢқмқҳ л…јлҰ¬лЎң мқён•ң 비극мқҙ м•„лӢҗк№Ң мӢ¶лӢӨ.
нӮӨмҡ°лӢӨ лӮҙлІ„л Өм§Җкі л¬ҙмұ…мһ„н•ҳкІҢ л°©м№ҳлҗҳлҠ” кі м–‘мқҙл“Ө. нҳҗмҳӨмӢңм„Ө ліҙл“Ҝ н•ҳлҠ” м°Ёк°Җмҡҙ лҲҲмҙқмқ„ лЁ№кі мһҗлһҖ кІ°кіјк°Җ мҳӨлҠҳмқҳ кёёкі м–‘мқҙл“Өмқ„ л§Ңл“ кұҙ м•„лӢҢм§Җ лӘЁлҘј мқјмқҙлӢӨ.
м§ҖкёҲмқҙлқјлҸ„ мҡ°лҰ¬к°Җ мӮҙм•„к°ҖлҠ” кіөк°„ мҶҚм—җм„ң н•Ёк»ҳ мҲЁ мү¬лҠ” лӘЁл“ кІғл“Өкіјмқҳ мЎ°нҷ”лҘј лӘЁмғүн•ҳлҠ” кі лҜјмқҙ н•„мҡ”н•ҳм§Җ м•ҠмқҖк°Җ мғқк°Ғн•ҳкІҢ лҗҳлҠ” мқҙмң к°Җ м—¬кё°м—җ мһҲлӢӨ.
м§ҖкёҲ мқҙ мӢңк°„м—җлҸ„ кёё мң„лҘј л– лҸ„лҠ” мҲҳл§ҺмқҖ кі м–‘мқҙл“Өкіјмқҳ мҰҗкұ°мҡҙ м—¬н–үлІ•мқ„ к¶ҒлҰ¬н•ҙ ліёлӢӨ.
2011-09-14 30л©ҙ
Copyright в“’ м„ңмҡёмӢ л¬ё All rights reserved. л¬ҙлӢЁ м „мһ¬-мһ¬л°°нҸ¬, AI н•ҷмҠө л°Ҹ нҷңмҡ© кёҲм§Җ